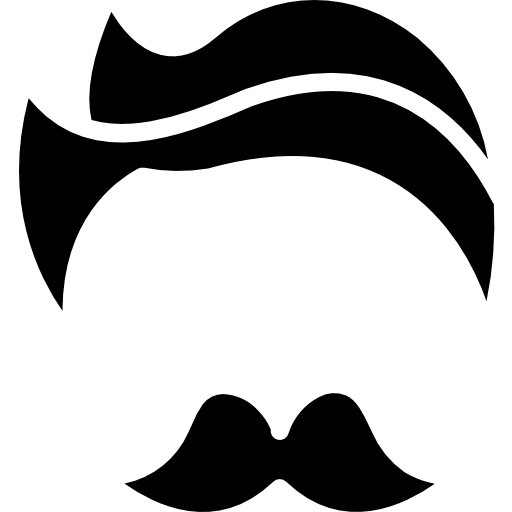Day 24. 내 안에 입력된 채널 편성표
아스토르가(Astorga) – 폰세바돈(Foncebadon)
: 7시간 (28Km)
잠시 스친 인연이 있다. 그녀들은 대전에서 왔는데, 두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산 세바스타안(San Sebastián)으로 떠난 현정이와 지혜, 오늘 함께 걸을 혜영이와 지영이 그리고 잠깐 마주친 몇몇 순례자들도 절친끼리 까미노에 왔다고 했다. 산티아고에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 걷고 싶은 버킷 리스트도 포함인가 보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주 경험하듯, 절친이 아닌 새로운 멤버와 함께 걷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그녀들과 서로 어색한 듯 아닌 듯 자기만의 가면을 쓰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은 채 그렇게 걷고 있다. 역시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에는 늘 유격이 존재하는 법인가 보다.
출발하기 전, 오늘 걷게 될 지도를 살펴보니 ‘라바날 델 까미노(Ravanal del camino)’부터 경사가 높아졌다. 적당히 라바날까지 걸을까 생각도 했지만, 중간에 멈춰 서기 애매 해 ‘폰세바돈(Foncebadon)’까지 더 걸어볼 예정이다. 예상대로 라바날까지는 무난하게 왔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 산 위의 마을 폰세바돈(Foncebadon)이 나타나기까지의 급경사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간 만에 땀을 흠뻑 흘렸다. 오르막에서도 평지에서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려다 보니 혜영과 지영 두 친구와 멀어졌다. 오늘 그녀들과 묵게 될 마을이 같았기에 나는 먼저 숙소를 잡고 일행을 맞이하기로 했다.
폰세바돈은 높은 경사를 깎아 만든 산 위의 아담한 마을이다. 하필 어젯밤 미리 봐둔 알베르게가 경사의 꼭대기에 있었다니. 지친 몸을 이끌고 기어서 숙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미리 방 배정을 받은 후 곧 도착할 두 친구를 맞으러 다시 마을 입구로 내려갔다.
그런데 기분 탓일까, 아니면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 그녀들이 나의 수고와 애씀을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 두 친구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급격히 내 기분마저 가라앉았다.
콤포스텔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숙소를 잡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된다. 순례자들은 늘어나고 알베르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두 사람은 앞일에 관해 별걱정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걸까? 두 사람의 무뚝뚝한 표정에 갑자기 서운함이 몰려왔다.
물론 내가 본 두 사람의 반응은 내가 잘못 본 것일 수 있다. 아니면 몹시 지쳐서 반응할 힘이 없었을 수도. 그렇다면 뭔가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로 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인데, 대체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하는 이 내면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회 신부인 ‘앤소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는 이러한 낙담과 기분 상함은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몫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와 나눈 그의 대담을 들어보자.
“‘누군가 신부님을 경멸할 때 신부님은 낙담하지 않나요? 왜 낙담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편지를 받지 않았을 때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건 되돌아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멸시를 당했는지, 왜 멸시를 당해서 낙담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작은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인간이란 뜻인가요? 누구든 배후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뛰어오르는 그런 존재가?” (앤소니 드 멜로, 『깨침과 사랑』, 분도출판사, 2016, p.103-104)
앤소니 신부는 우리가 낙담을 하는 건 우리 안에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말한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닐 테다. 이 말은 상대를 통해 왔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기에 어쩌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나를 화나게 한 그 상대 자체가 아니라 결국 내 안을 건드린 그 ‘무엇’이라는 말이 된다.
사람은 이 ‘무엇’을 알아채고 잘 돌봐주어야 치유가 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내 실망감은 그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들과는 무관한, 내 안에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너무 진지했나?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작가야
문학과 여행 그리고 사랑 💜
www.youtube.com
'Santiago'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티아고 에세이> Day 27. 길들여진다는 것의 기쁨과 슬픔 (0) | 2018.04.14 |
|---|---|
| <산티아고 에세이> Day 25. - Day 26. 다 식은 커피 같을 때가 있다 (0) | 2018.04.10 |
| <산티아고 에세이> Day 23. 절박함이 만들어낸 해결책 (0) | 2018.03.28 |
| <산티아고 에세이> Day 22.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저녁 (0) | 2018.03.20 |
| <산티아고 에세이> Day 20 - Day 21. 그래도 혼자보다 여럿이 낫다 (0)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