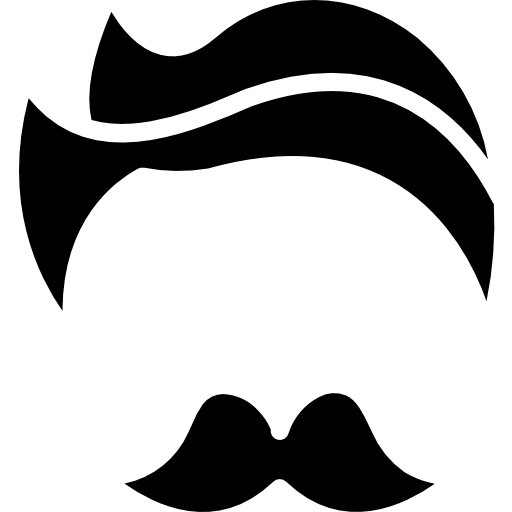2025년 2월 18일 화요일 / 목덜미가 뻐근한 아침
"아기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보호의 품은 깨어졌으나 홀로 걸어갈 내 안의 무언가는 깨어나지 못한 나이(일곱 살). 문득문득 한낮의 어둠이 찾아오고 한밤의 몽유가 걸어오고, 자주 세상의 소리가 끊어졌고 이 지상에 나 혼자인 듯 아득해지곤 했다." (박노해, <눈물꽃 소년>, 느린걸음, 2024, p.45)
소설가 김연수는 청춘을 일러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정거장 같은 나이. 늘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또 떠나보내는 데 익숙해져야만 하는 나이. 옛 가족은 떠났으나 새 가족은 이루지 못한 나이" 당시 이 문장에 왜 그렇게 공감이 됐을까. 내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오늘 박노해 선생의 책을 읽다가 그보다 더 어린 시절을 정의하는 이야기를 보았다. 그가 직접 경험한, 그것도 슬픈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럴까? 청춘보다 훨씬 따뜻해야 할 그 시절 이야기에 괜히 가슴이 아리다. 그는 일곱 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아기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보호의 품은 깨어졌으나 홀로 걸어갈 내 안의 무언가는 깨어나지 못한 나이"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때이다. 박노해 선생은 일곱 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다. '아기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보호의 품은 깨어졌으나 홀로 걸어갈 내 안의 무언가가 깨어나지 못한 나이' 어린 시절과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인생의 방향이 잘 보이려나? 다들 그렇다고 여기며 사는 건 아닐는지.
이작가야의 말씀살롱
살롱(salon)에서 나누는 말씀 사색
www.youtube.com
- 저자
- 박노해
- 출판
- 느린걸음
- 출판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