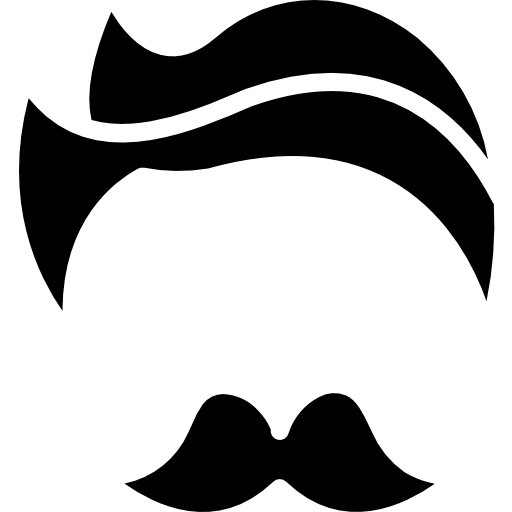자신을 향한 부정의 언어를 거두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은 스스로를 향한 자책의 언어를 육체의 고통으로 바꿨을 때 그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방금에 한 말이 한 가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릴케가 말한 ‘당신의 일상이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경우’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랑은 뭐지? 신은 또 뭘까? 삶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생기를 잃은 셀프 탁상담론이다. 작가 이승우와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토르의 뿅망치를 날린다.
이승우 작가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 그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물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또 신의 활동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묻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살지 않는 자가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도 정의되지 않는 것이 신, 삶, 사랑이기 때문에.
조르바는 늘 제자리에 머물며 고심만 하는 두목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 “인생의 신비를 사는 사람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줄을 몰라요.” 마찬가지 릴케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애정 어린 질책을 날린다. 그는 스스로의 일상에 풍요로움을 말로써 불러낼 만큼 아직 충분한 시인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창조자에게는 그 무엇도 보잘 것 없이 보이지 않으며 감흥을 주지 않는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매순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가끔 고민의 끈을 모으고 모아 이런 글이나 남긴다. 작가 김영하는 ‘기록한다는 것’은 조수간만처럼 끊임없이 침식해 들어오는 인생의 무의미에 맞서는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신의 뜻을 알고 싶어 산티아고에 몸을 던져보았고, 삶을 알고 싶어 이런저런 자기 극복의 시도를 했고 또 하고 있고, 사랑을 알기 위해 매혹적인 대상에게 용기 내 다가갔다. 어쨌든. 뭐든. 몸을 움직인다.
이작가야의 말씀살롱
안녕하세요. 이작가야의 말씀살롱(BibleSalon)입니다. 다양한 감수성과 인문학 관점을 통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앙이라는 순례길에 좋은 벗이 되면 좋겠습니다!
www.youtube.com
'Ess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행동 (0) | 2017.09.25 |
|---|---|
| [에세이] 뒤통수와 미용실 (0) | 2017.09.18 |
| [에세이] 나는 당신을 모른다 (0) | 2017.08.30 |
| [에세이] 걷는 게 좋다 (0) | 2017.08.30 |
| [에세이] 책 앞의 유혹 (0) |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