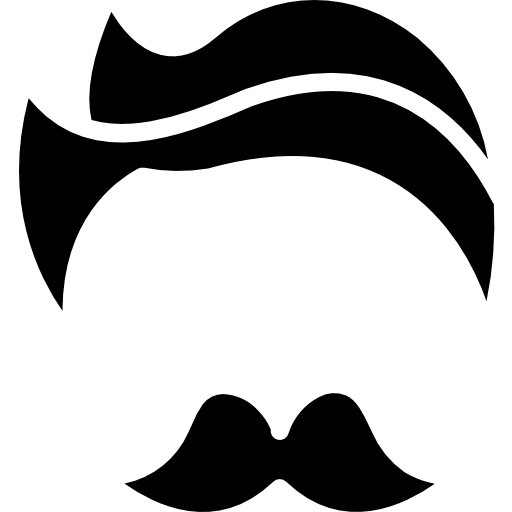이발 할 때의 기준이 뒷머리의 길이가 된 적이 있다. 어느 날 뒷머리를 거울로 비춰보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보기도 싫어 곧장 미용실로 향했다. 지금 다니는 미용실로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갔던 동네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께 조금 전의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자 뒷머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사람들은 주로 뒷모습보단 앞모습을 보고 머리 자를 때를 판단해 온다고 했다. 나도 늘 그래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뒷머리가 보기 싫어 미용실로 간 적이 있었던 것이다.
늘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날따라 디자이너 선생님의 대답이 새롭게 들렸던 건 왜일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모습보다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좀 서글프고 답답해서였을까.
사실 ‘앞모습’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싶은 나의 속마음이 투영된 말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여 지고 또 비춰지고 싶은 나의 모습. 우리는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갈수록 그러하기 어려운 좀 특별한 세상 속에 있는 듯하다.
‘사람은 자신의 뒤통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뒤통수에 사람의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그것과는 좀 다른 ‘남들이 보는 나’를 구분 지으려는 시도의 표현일 테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가 아는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나’가 더 객관적이고 중요한 시선이라고 여기며 산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귀 기울이다 못해 무릎을 꿇은 적도 여러 번 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본인의 의식을 넘어선 내면의 반응이기에 무게 중심을 잃는 건 아주 자연스러우며 단숨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럼 이젠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아는 나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면 되는 걸까. 그렇지도 않다. 자기 자신 안에 함몰되어 자기 성벽을 쌓고 사는 사람의 삶은 또 어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쉽게 쓰이는 말이지만 가장 살아내기 어려운 말인 ‘적절함’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땅이라도 파 봐야하나.
알랭 드 보통은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 뒤통수를 보고 이런저런 말을 떠벌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귀 기울일 만한 말인지 끊임없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은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두 입장을 두고 그 해결책을 끊임없이 줄 타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
그러면 됐다. 이제 앞모습이 맘에 안 들 때나 뒤통수가 맘에 안 들 때 언제든지 미용실에 가도 될 명분이 생겼다. ‘적절함’과 ‘균형’의 입장에서보자면 이만한 명분이 없다. ‘명분이 생겼다 아이가, 명분이.’ 의식하며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작가야의 이중생활
문학과 여행 그리고 신앙
www.youtube.com
JH(@ss_im_hoon)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팔로워 189명, 팔로잉 168명, 게시물 428개 - JH(@ss_im_hoon)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www.instagram.com
기억의 저장소 : 네이버 블로그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이지 않은 공간
'Ess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 가을 속 지기춘풍 (0) | 2017.10.13 |
|---|---|
| [에세이]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행동 (0) | 2017.09.25 |
| [에세이] 살아보는 거다 (0) | 2017.09.07 |
| [에세이] 나는 당신을 모른다 (0) | 2017.08.30 |
| [에세이] 걷는 게 좋다 (0) |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