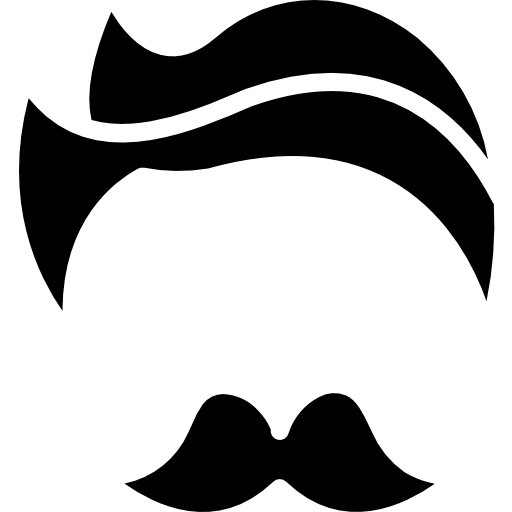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나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와
시안으로 데려갔던 감각과 즐거움이 되살아났었다.
그때 나는 혼자서 하는 여행이
만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영혼들은 서로를 어루만지고,
우정(우정은 일시적이지만, 어쩌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행에 동력을 불어넣는 연료가 될 수 있다)이
샘솟는 이 순간이 좋다.
베르나르 올리비에, <나는 걷는다 끝.>, 효형출판
일흔이 훌쩍 넘은 노인 ‘베르나르’가 리옹에서 이스탄불까지 걷는 이야기를 읽다보니 작년 생각이 났다. 지난 해 5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적 없는 미지의 땅을 걷고 있었다. 여행 혹은 순례 준비를 하며 함께 떠날 파트너가 떠오르진 않았지만 당시 그것보다 나를 더 사로잡고 있었던 건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해 보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 때의 시간을 반추해 보니 모든 곳에 ‘만남’이 있었다. 설렜던 만남, 유쾌한 만남, 불쾌하고 민망한 만남 등 혼자 떠난 여행자는 수많은 만남에 노출 돼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했고 또 그만큼 기대로 가득찼다.
책의 저자 ‘베르나르’는 긴 도보 여행을 하며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난다. 낯선 여행자를 환대하는 그 환대의 경험을 단 하나도 잊지 않았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도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신비와 ‘여행’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줬다. 돈은 최소만 지출했다. 물론 호화로운 여행을 내려놓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더 다양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그의 글을 쫓아가다보니 산티아고 순례를 하며 만났지만 잠시 잊혀졌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생장에 도착하기 전인 바욘에서부터 낯선 인연이 시작되더니 크고 작은 마을을 지나며 영구적인 우정과 일시적인 우정을 경험한다. 이 모든 우정이 여행의 동력이었다.
베르나르는 발칸반도를 지나며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번갈아 걷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며 만난 사람들은 낯선 순례자를 종교에 따라, 재산에 따라, 생김새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사람’으로, 한 명의 ‘여행자’로 수용됐다. 무조건적인 환대의 장이 열린다.
그렇다. 혼자 떠났을 때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연과 우연이 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우리 내면에 드리운 차이와 편견의 장벽을 허문다. 그렇기에 여행은 아주 훌륭한 교육의 현장인 것이다.

이작가야의 이중생활
문학과 여행 그리고 신앙
www.youtube.com
'Ess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렇게 (0) | 2018.02.22 |
|---|---|
| [에세이] 기품은 몸에서 나온다 (0) | 2018.02.08 |
| <삐딱하게 사랑보기> 1. 운명의 짝은 어디 있을까? (0) | 2018.02.03 |
| [에세이] 걸음걸이와 사람 (0) | 2018.01.24 |
| [에세이] 여행이란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