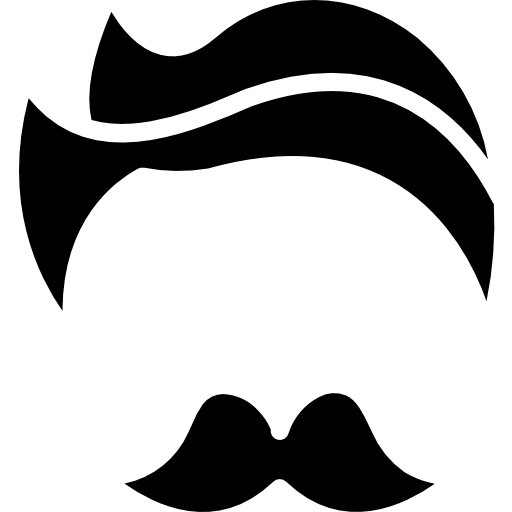"죽음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질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오는 깨달음은 질문의 형식으로 온다. 죽음은, 유일한 질문이다. 삶의 모든 경험이 바쳐져서 만들어낸 단 하나의 질문이다." (이승우, ) 죽음은 종착지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얻게 될 마지막 대답인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라면? 죽음 가까이 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답이 있어야 하는 하나의 질문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혼란스럽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온 삶의 경험은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또 삶의 모든 경험이 바쳐서 만들어낸 단 하나의 결과물이 죽음이라면 삶을 지속해야 했던 당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은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질문은 답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답..